이미지 클릭하면 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숲속의소리
2009.01.03 21:13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댓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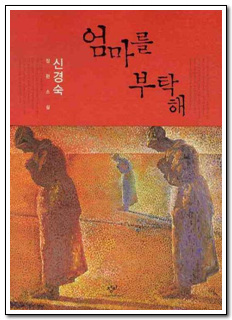
▲ 엄마를 부탁해 일상의 자리에서 설 곳을 잃은 우리네 엄마들의 삶을 통해 엄마로 사는 삶을 돌아보는 신경숙 장편소설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명옥 (mmsarah)
일상의 삶에서 이미 늘 비어있던 엄마의 자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이 아닌 바로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가 있었다. 잊혀짐과 기억됨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는 스틱강보다 더 머나 먼 거리에 자리하나 보다.
신경숙의 소설을 접한 것은 참 오랜만이다. 물론 그녀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느끼던 풋풋한 서정성,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문체를 기억하며 이따금 찾아 읽기는 했지만 <외딴방>은 한 마디로 불편했고, <바이올렛>은 내 기대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신간 <엄마를 부탁해>는 요즘 소설에 손을 잘 대지 않던 터라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입소문이 건네져 오며 이상하게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소설은 황당하게도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된다.
저 첫 구절을 읽자마자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되는 까뮈의 <이방인>의 첫 구절인 뫼르소의 독백이 떠올랐다. 조금 불편해지려는 마음을 억누르고 읽어 낸 마지막 장의 에필로그는 또 이렇게 시작이 된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개월째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식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불편함은 이따금씩 통증을 유발시키는 가시 같은 것일 뿐 변한 것은 없다. 그쯤에서 '어미'라는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살아 온 내 삶의 자락을 들춰보게 되었다. 그리곤 괜한 서글픔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끝도 없이 꾸역꾸역 밀려나왔다. 이 서글픔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
결혼 생활 20년째인 내게도 아들 아이가 하나 있다. 나 역시 이명옥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라는 익명성 즉 '현이 엄마'로 십여 년을 넘게 살았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이 불행했던 것 같다.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부분 기실은 내 안에서 극복되지 못한 감정들이 불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 일흔이 넘어 자식들 집으로 생신상을 받으러 오다가 서울역에서 남편 손을 놓쳐버려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치매의 여인. 50년 이상 지속된 그 여인의 '어미'로서의 또 한 여인으로서의 삶에 정작 그 여인의 실체는 없었다.
이 땅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여인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족의 울타리로서의 삶에 만족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왜 그 여인이라고 해서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욕망이나 바람이 없었을 것인가.
그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 흔적을 감추는 행위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늘 그림자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사라짐을 통해 흔적을 남김으로 오히려 존재 그 자체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온갖 몸부림 끝에 가까스로 내 이름 석 자 이. 명. 옥을 되찾았을 때 난 비로소 그림자가 아닌, 하나의 또렷한 형상과 정체성을 지닌 실체인 이명옥으로 되돌아 왔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오로지 나 이명옥, 개인으로 기억한다. 아들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조차 이제 사람들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아들아이를 지칭한다.
그렇다고 내 삶이 <엄마를 부탁해> 속 여인의 삶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위상이나 정체성이 울타리 밖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많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받고 이해받지 못한 삶, 진정한 이해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봉합하여 사는 삶이 가져다주는 공허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보다. 드러내는 사랑과 표현이어야 깊이를 읽어내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것인지 모른다.
말이란 게 다 할 때가 있는 법인디…. 나는 평생 니 엄마한테 말을 안하거나 할 때를 놓치거나 알아주겄거니 하며 살었고나. 인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디 들을 사람이 없구나......
지현아?
예.
부탁헌다… 니 엄마… 엄마를 말이다.
딸이 참지 못하고 수화기 저편에서 어--어어 소리내어 울었다. 당신은 송아지 같은 딸의 울음소리를 수화기 귀에 바짝 붙이고 들었다.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수화기 줄을 타고 딸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당신의 얼굴도 눈물범벅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딸은 기억할 것이다. 아내가 이 세상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을, 당신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엄마'는 필요하다
곳곳에 흩어져 사는 아들과 딸에게 철마다 김장을 해 나르고, 청국장과 된장을 만들어 부치고 매실과 온갖 과일을 모아 과일주를 담아 놓고 명절에 찾아와 그 술병을 비워 줄 날을 기다리는 것이 파란 슬리퍼를 신고 실종된 여인이 마지막까지 살아 온 삶의 방식이었다.
글을 읽을 줄 몰라 딸이 쓴 소설을 다른 이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여인, 딸이 세미나다, 문학기행이다 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 그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며 언젠가는 성 베드로 상 앞에 서 보고 그곳에서 파는 장미 묵주를 사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일평생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산 한 여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어난 산골마을 진뫼의 고향집에서 집 마루에 걸터앉은 '엄마'를 본다. 그리고 비로소 영원한 귀환에 이른다는 평론가의 말이 작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 어떤 이론이나 현학적인 말로 '엄마'라는 존재나 '모성' 따위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한가지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돌아가 안길 '엄마'의 품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엄마가 파란 슬리퍼에 움푹 파인 내 발등을 들여다보네. 내 발등은 푹 파인 상처 속으로 뼈가 드러나 보이네. 엄마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지네. 저 얼굴은 내가 죽은 아이를 낳았을 때 장롱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네.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엄마가 방금 죽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네. 내 발에서 파란 슬리퍼를 벗기고 나의 두 발을 엄마의 무릎으로 끌어 올리네. 엄마는 웃지 않네. 울지도 않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덧붙이는 글 | <엄마를 부탁해>는 신경숙 장편 소설로 창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2009.01.03 17:49 ⓒ 2009 OhmyNews
출처 :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 오마이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 나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2 | 이명옥 | 2009.01.03 |
| 2484 | 서도반 전시회를 다녀온 소감 2 | 김상연 | 2008.12.31 |
| 2483 | 2008 모두모임 참가자와 정산 2 | 그루터기 | 2008.12.29 |
| 2482 | 신영복선생님 신년특강 또 있습니다^^ 12 | 노회찬마들연구소 | 2008.12.29 |
| 2481 | 선생님 강연 소개 4 | 강연소식 | 2008.12.27 |
| 2480 | 문득 2 | 박 영섭 | 2008.12.26 |
| 2479 |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 2 | 소나무 | 2008.12.26 |
| 2478 | 반가운 인연입니다 2 | 송정복 | 2008.12.24 |
| 2477 | 더불어 산다는 것 8 | 이명옥 | 2008.12.22 |
| 2476 | 모두모임- 감동과 사랑의 나눔 감사합니다. 3 | 윤미연 | 2008.12.22 |
| 2475 | 행복했었던 2008.12. 20 3 | 이재순 | 2008.12.22 |
| 2474 | 모두모임에 다녀와서.. 2 | 정재형 | 2008.12.21 |
| 2473 | 촛불 후기와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 레인메이커 | 2008.12.21 |
| 2472 | "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올해 다짐에 회한" 4 | 허필두 | 2008.12.20 |
| 2471 | 염치없는 놈 입니다. 7 | 김우종 | 2008.12.19 |
| 2470 | 사소한 일.1 2 | 김성숙 | 2008.12.18 |
| 2469 | 유천스님께 5 | 박명아 | 2008.12.18 |
| 2468 | [re]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 | 그루터기 | 2008.12.18 |
| 2467 |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는 한반도운하의 단계별추진 1 | 운하반대 | 2008.12.16 |
| 2466 | 촛불을 밝히며 시린 손을 호호 불다가 4 | 레인메이커 | 2008.12.15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