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古城) 밑에서 띄우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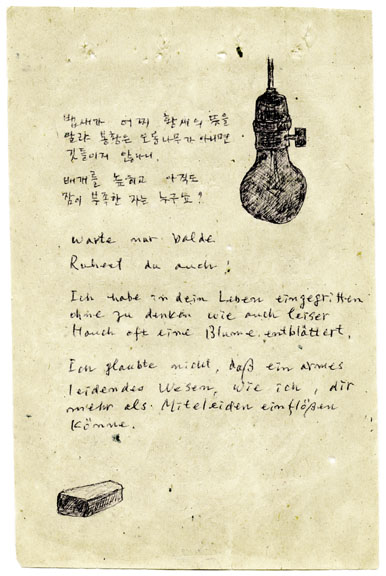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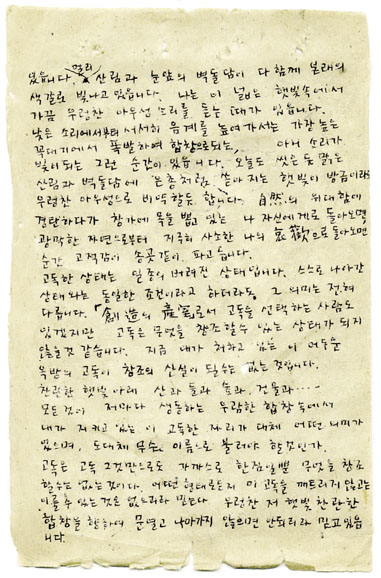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 유형지의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더 축축한 것으로 만듭니다. 저마다 권태로움에 젖어드는 자신의 마음을 구하려 하지만 이미 수렁에 던져진 바위처럼 마냥 밑으로 밑으로 침하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처지에 다시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가상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가상 속에서 상당한 분량의 위로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상에 의탁한 위안이 허무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상이 무너질 때, 허황한 착각에서 깨어날 때, 퍼뜩 제정신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침통한 마음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물쇠 채우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귓전을 칠 때, 또는 취침 나팔의 긴 여운이 울먹일 때, 또는 잠에서 막 깨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때에는 어김없이 현실의 땅바닥에 떨어져버린 한 마리씩의 깃이 젖은 새처럼 풀죽은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과 땅 사이를 배회하는 가상 속에서 오히려 옥살이라는 고통과 위로를 혼동하며, 고통이든 위로든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자꾸만 밑이 꺼지는 공허를 어쩔 수 없습니다. 진흙바닥에 발이 박혀서 신발마저 뽑아내지 못한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
이제 한 달 안으로 이 고성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22일 하얗게 눈에 덮인 이 산성으로 실려온 지 벌써 1년 5개월, 그동안 나는 많은 것들을 여기 이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남한산성에서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 역시 이 땅 속에 묻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나 한 사람만의 사연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니라 민족의 수난과 치욕이 멍든 비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조 16대 임금 인조가 청나라 태종의 말 아래 무릎을 꿇고 항복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이 약 300년 전의 일이고 보면 아직도 이곳 어디엔가 묻혀 있을 혈흔을 파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큰 소나무가 다섯 그루 서 있습니다. 나는 노대위와 함께 저 소나무 밑에 앉아서 이쪽을 굽어보며 술 한 잔 기울일 것을 약속해두었습니다.
지금 막 취침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취침 나팔을 스피커를 통하여 녹음방송하기 때문에 이 소리마저도 나무토막처럼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 잃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감자 나팔수가 옥상에 올라가서 설레는 가슴으로 불었었는데 지금은 그도 출감해버리고 불 만한 사람이 없나 봅니다. 며칠 전 중앙에 들렀더니 거기 벽 구석에 그 나팔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잠시 쓰다듬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지 윤기도 없고 군데군데 얇은 녹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신발처럼 쓸쓸한 행색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곤한 몸들을 누이고 잠들어버린 듯 주위는 무덤 속 정적입니다. 송형모, 하종연, 김태일랑 세 명도 내 옆에서 고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이야기 하나 들려달라고 그리도 졸라대더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축대가 깨져 판잣집이 내려앉고, 태풍 '올가'호가 휩쓸어 산이 무너지는 등 숱한 재산, 인명이 또 한 번 액운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곳에서 비닐우산 한 자루 없이도 태무심으로 걱정 하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감옥의 벽은 태풍에도 꿈적 않을 만큼 견고하고, 높고 작은 반달창은 해가 떴는지 별이 떴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얻은 평정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평정함이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주룩주룩 그치지 않는 빗소리는 이런 나의 심경을 축축하고 무거운 곳으로 끌어내리고 마침내 질퍽한 진흙바닥에 나앉게 합니다. 어깨가 젖고 가슴이 젖는 듯한 무거운 상념에 젖어듭니다. 이처럼 빗소리에 새삼스레 무거운 마음이 되는 까닭은 아직도 내게 숱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를 창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요사이 나는 지난 일들을 자주 떠올리고, 또 그것들을 미화하는 짓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과거가 가장 찬란하게 미화되는 곳이 아마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에는 과거가 각박한 사람이 드뭅니다. 감옥을 견디기 위한 자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자위는 참혹한 환경에 놓인 생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운동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자위는 물론 엄한 자기성찰, 자기비판에 비하면 즉자적(卽自的)이고 감성적인 생명운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필요에 대하여 너무 심하게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불모의 영토마다 자리잡고 있는 과거라는 이름의 숲은 실상 한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늘도, 샘물도, 기대앉을 따뜻한 바위도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나는 벽 앞에 정좌하여 동공을 나의 내부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내부란 과거와 미래의 중간입니다. 과거를 미화하기도 하고, 현재를 자위하기도 하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색이 머리 속의 관념으로서만 시종(始終)하는 것이고 보면, 앞뒤도 없고 선후도 없어 전체적으로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내부에 한 그루 나무를 키우려 합니다. 숲이 아님은 물론이고, 정정한 상록수가 못됨도 사실입니다. 비옥한 토양도 못되고 거두어줄 손길도 창백합니다. 염천과 폭우, 엄동한설을 어떻게 견뎌나갈지 아직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나무는 나의 내부에 심은 나무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가슴을 헤치고 외부를 향하여 가지 뻗어야 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과거에다 심은 나무이지만 미래를 향하여 뻗어가야 할 나무입니다. 더구나 나는 이 나무에 많은 약속을 해두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킬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 아프더라도 자위보다는 엄한 자기 성찰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유난히 햇빛이 밝은 날입니다. 어제 내린 비가 온갖 먼지를 씻어낸 자리에 오늘은 일제히 햇빛이 내려쪼이고 있습니다. 멀리 산림과 눈앞의 벽돌담이 다 함께 본래의 색깔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넓은 햇빛 속에서 가끔 우렁찬 아우성소리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낮은 소리에서부터 서서히 음계를 높여가서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폭발하여 합창으로 되는, 아니 소리가 빛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씻은 듯 맑은 산림과 벽돌담에 은총처럼 쏟아지는 햇빛이 방금이라도 우렁찬 아우성으로 비약할 듯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다가 창가에 목을 뽑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광막한 자연으로부터 지극히 사소한 나의 애환으로 돌아오면 순간 고적감이 송곳같이 파고듭니다.
고독한 상태는 일종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나아간 상태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의 산실'로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독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옥방의 고독이 창조의 산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 산과 들과 숲과, 건물과…… 모든 것이 저마다 생동하는 우람한 합창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고독한 자리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인가.
고독은 고독 그것만으로도 가까스로 한 짐일 뿐 무엇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독을 깨뜨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우렁찬 저 햇빛 찬란한 합창을 향하여 문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Articles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