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일 | 2016-01-23 |
|---|---|
| 미디어 | 한겨레신문_오승훈 |
신영복, 그는 본디 붉은 경제학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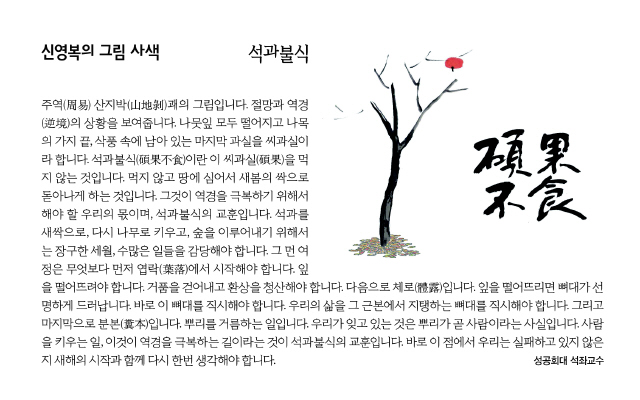
<한겨레> 토요판 2012년 1월28일치에 실린 ‘신영복의 그림사색’. 신영복 선생은 그해 5월19일치까지 이 칼럼을 연재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 신영복의 학문 궤적
“오늘날의 주류 담론인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화 논리는 한마디로 거대 축적 자본의 사활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본축적 과정의 전형적 형태입니다.”(신영복, <강의>)
동양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시서화에 능한 인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신영복은 본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정치경제학자였다. 그는 대학 시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으로, 가장 정합적인 실천과학’으로 받아들이며 정치경제학을 자기 학문의 밑절미로 삼은 ‘붉은 경제학도’였다.
모리스 돕과 폴 스위지, 다카하시 고하치로 등 좌파 경제학자들이 벌인 ‘자본주의 이행논쟁’에 기대 서양의 봉건제 해체과정을 노동력의 사회적 존재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논문(‘봉건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연구’)으로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 젊은 연구자의 앞길은 제법 전도유망해 보였다.
그러나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여긴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내면화한 제3세계의 급진적 지식인이 설 곳은 많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숙명여대에서 후진국개발론을 강의하며 학생운동 서클 간부로 활동하던 신영복은 남한사회 반체제운동의 주류로 자리잡아온 엔엘(NL·민족해방주의) 노선에 기초한 혁명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 2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됐다.
역설적이게도 그 잔인한 세월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그를 인문학적 사상가로 거듭나게 한 시간이었다. 그의 표현대로 감옥은 그에게 또다른 ‘학교’였다.
고전·서예 능통한 인문학자 신영복
원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변화 도구로 인문학 일깨운 징역
낮은 데서 깨친 인간에 대한 이해
정치경제학에 인문학 더한 ‘관계론’
관념화·교양화 등 비판 나오기도
“외연 확대 중요하다”던 그의 담론
진보의 도구로 만드는 건 우리의 몫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1988년 가석방될 때까지 그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동양고전이라는 숫돌에 자신의 칼이었던 정치경제학을 벼리고 또 벼렸다. 곁에 두고두고 읽던 노자의 <도덕경>은 사회주의자의 이념적 경직성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했고, 밑바닥 인생들과 뒹굴며 깨친 노동의 덕목은 ‘흰 손’을 가진 인텔리의 관념적 급진성을 성찰하게 했다. 그 서늘한 각성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사색>)이었다. <사색>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그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혁명적 인간의 글모음”이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그것은 이 책을 한낱 지당한 ‘공자님 말씀’들로 이루어진 인생론집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된다”는 지적(김명인)은 그래서 옳았다.
이른바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는 시기에도 우연히 만난 가난한 아이들과 ‘청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맑디맑은 우정을 나눈 일이나, 투옥 뒤 대전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작성한 전향서에 대해 “지금 다시 그때가 되더라도 전향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 그에게 학교는 애시당초 불필요했을 것도 같다. 강퍅한 이데올로그가 되기엔 그는 너무 순했고 차가운 사회과학도로 남기엔 그는 너무 뜨거웠다.
1989년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그가 맡았던 과목들이 정치경제학과 한국사상사, 고전강독이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너른 이해 없이 메마른 사회과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전을 통한 인간 사랑이 그를 초월적인 달관의 경지로 이끌진 못했다. 2004년 <주역>에서 법가까지 자신의 동양고전에 대한 해석을 담은 <강의>를 펴내며 근대의 존재론적 인식을 넘은 관계론적 철학을 이야기할 때도 그의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은 여전히 또렷했다.
고전을 알기 쉽게 소개시켜주는 지혜로운 인문주의자나 소주병에 글씨를 쓴 탁월한 서예가로만 신영복을 기억할 수는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에게 인문학은 정치경제학 인식을 실천으로 매개할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인식한 이가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이 바로 인문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해방적 또는 문명성찰적 진보주의’(김호기)로 명명된 그의 ‘담론’이 진보진영 내에서 늘 환대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출소 이후 줄곧 직접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이 없다는 점, 지배세력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신영복의 “사상이 ‘고통의 바깥 자리’에서 교양의 한 자락으로 변모돼” 갔다고 비판했다.
통혁당 장기수 출신인 그에게 씌워질 친북좌익이라는 딱지가 행여나 단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88년 정국에서 운동권의 제도권 진출 등 기회주의적 작풍에 대한 환멸 때문에 사회운동단체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는 해명을 그는 중뿔나게 하지 않았다. <사색>에서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욕을 먹는 이들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일처럼.
다만 그는 관념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실천은 내포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의 글처럼 “여럿이 함께 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민적 자유와 복지 시스템 등 근대(존재론적인 사회)가 구현한 제도조차 이루지 못한 유사 파시즘 국가인 한국에서 일종의 탈근대 담론인 관계론적 세계관이 일견 공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가 남겨놓은 ‘희망의 원리’를 진보의 도구로 벼리는 일은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오승훈 기자
Articles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