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하면 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숲
킬리만자로의 표범
동물은 정신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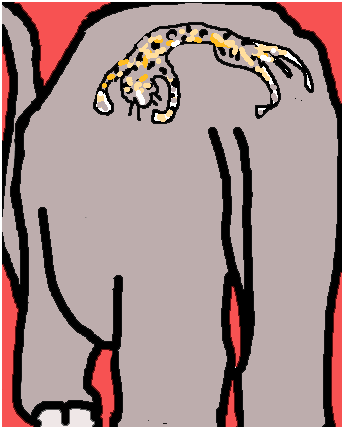
동물은 정신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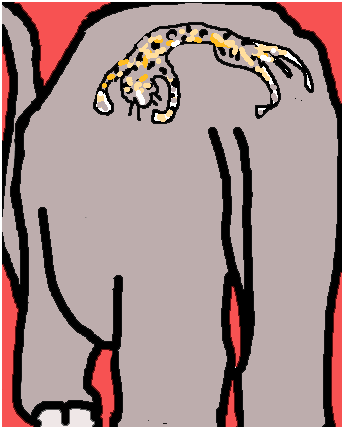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아프리카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정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만년설로 더욱 신비로운 산입니다. 나는 적도(赤道)의 만년설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킬리만자로에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며 해 저무는 아프리카의 초원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마사이족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구름이 걷힌다고 장담했고 또 이미 정상의 흰 눈이 반쯤 구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 부근에 얼어죽은 표범의 시체가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헤밍웨이가 그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서두에 화두처럼 던져놓은 구절입니다. 나는 표범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표범이 킬리만자로 꼭대기, 만년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기도 합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눈이 있는 곳은 적어도 5천 미터 이상이니까요.”
“만년설 부근에서 혹시 한번쯤 표범 시체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동물이 원숭이 입니다만 원숭이도 4천 미터 이상은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정신병에 걸린 표범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천만에요. 동물은 정신병에 걸리는 법이 없을걸요? 정신병은 사람들만 걸리는 병일걸요?”
사람만이 정신병에 걸린다는 말에 나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한가롭게 초원을 걷고 있는 동물 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빈손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빼앗길 만한 물건들을 소유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헤밍웨이의 소설은 한 남자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정직하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유럽의 지식인이 원시의 땅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죽음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헤밍웨이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 저무는 킬리만자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문득 얼어죽은 표범이 혹시 아프리카의 대각점(對角點)에 있는 유럽의 '문화'와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문화와 도시는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초식동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식동물들을 먹이로 살아온 육식동물로 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표범으로 살아온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얼어죽은 표범이 문득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온 동물 사파리 관광객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느낌입니다.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바로 ‘동물의 왕국’ 케냐라는 설문조사가 말해주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문명에 지친 심신을 이끌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만년설을 찾아가는 지친 표범 같습니다.
도시는 한마디로 반자연(反自然) 공간입니다. 자연을 거부하며 자연과 끊임없이 싸우는 공간입니다. 내가 방문한 여러 도시들에서 받은 인상이 그랬습니다. 도시가 문화 공간이며 역사 공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의 거리를 문화의 높이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도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도시의 모습은 돈 없는 사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초라하였습니다. 단 하루라도 닦고 쓸고 때우고 칠하지 않으면 금새 회색 공간으로 남루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도시였습니다.
나는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당신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복고적 메시지를 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항 대립의 도식으로 문명사를 농단할 수도 없지만 이곳 아 프리카에서는 그 광활한 자연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가슴아프게 하는 자연의 황량함을 끊 임없이 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초원에서 선 채로 밤을 맞이하는 얼룩말 떼는 내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초원에서 그들은 서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은 아니었고 또 그것이 곧 자연이라고는 하지만, 육중한 아프리카의 어둠에 묻혀 그선 채로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암보셀리 롯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마리 원숭이와 독대한 일도 나의 생각을 한없이 휘저어 놓 았습니다. 멀고 먼 아프리카 들판에서 잠시 마주한 그와의 독대는 실로 우연의 극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도 나를 만난 것은 우연이고 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그의 생각을 모르고 그도 또한 모기에 물린 나의 말라리아 걱정을 알지 못합니다.
원숭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사이족 마을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 다. 잿불에 구운 감자 알같이 새카맣게 먼지 찌들은 아이들의 이마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이나 슬픔이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득한 거리감이며 쓸쓸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함이면서 동시에 허전한 자유그것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아마 이 아프리카 대륙의 황막한 원시 공간에서 깨닫는 개체로서의 나 자신의 무게가 낙엽처럼 하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누가 심지도 않은 외나무들이 띄엄띄엄 눈에 뜨입니다. 하나같이 키 작은 우산입니다. 거꾸로 든 우산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빗물 때문이라고 나무가 대답했습 니다. 인색한 빗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받으려는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발밑의 물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무리하려고 나지막이 팔 벌여 그늘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절실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은 간절한 소망이면서 생명이었 습니다. 내가 만난 원숭이나, 마사이족 마을의 어린이나, 한 포기 푸나무, 그리고 비록 선 채로 비 맞으며 잘 수밖에 없는 얼룩말들에게도 물은 생명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륙을 비행하면서 내려다보면 하얗게 멈추어 선 모래강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모래강. 저 강에 다시 물 흐르게 할 수는 없을까. 나는 만년설 부근에서 얼어죽은 표범과 함께 이 메마른 모래강에 목을 대고 죽어 있는 목이 긴 사슴을 생각합니다. 표범과 사슴이 동시에 구제되는 방법은 없을까? 아프리카에서 달리는 생각이 부질없기가 이와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아프리카의 밤은 참으로 찬란합니다. 어느 하늘 구석이든 잠시만 시선을 멈추 면 거기 가득히 별이 쏟아져내립니다. 시선을 타고 쏟아져내린 별들은 나의 가슴에 와서 분수처럼 퍼집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