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하면 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숲
멕시코 국립대학
정체성의 기본은 독립입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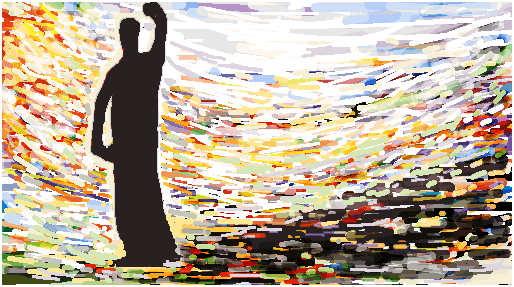
정체성의 기본은 독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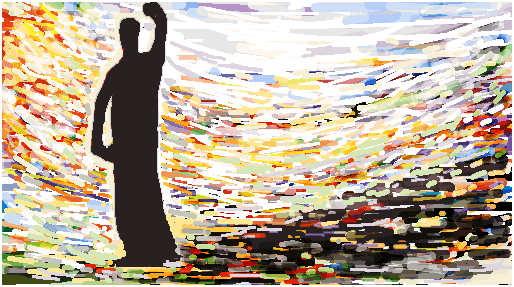
라틴아메리카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거의 반쯤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아마존에서는 물론이고 해발 3,400m 고지에 있는 쿠스코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발걸음을 조금만 빨리 해도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2,300m의 고지대에 있는 멕시코시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곤하게 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대지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혼혈에 혼혈을 거듭한 인종의 복잡함과 그 복잡한 사람들의 낙천적인 표정에 속에 묻혀 있는 실의와 가난이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대지를 덮고 있는 상록수의 초록빛이 그렇게도 미욱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의 엄혹함도 없고 가을의 추상같은 반성도 없이 대지를 덮고 있는 초록색이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 같았습니다. 나는 더위에 처진 풀잎처럼 몸도 마음도 곧추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라틴아메리카를 떠나기 전에 멕시코 국립대학의 넓은 캠퍼스에서 지친 심신을 쉬기로 하였습니다. 멕시코 국립대학을 찾은 것은 줄곧 짊어지고 다니던 라틴아메리카의 짐을 어디엔가 부려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과연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짐을 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국립대학은 대학도시(C.U.)라고도 합니다. 700만m²에 달하는 넓은 캠퍼스가 학생 30여만 명을 포용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1968년에 개최된 멕시코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 바로 대학의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의 벽면에는 라틴아메리카를 상징하는 콘도르와 멕시코의 상징인 독수리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입니다. 제3세계의 리더임을 자임하는 멕시코의 패기를 과시하는 벽화입니다.
나는 중앙 도서관의 외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자이크 벽화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린 이 벽화는 아즈텍 문화에서 식민지 시대와 독립, 그리고 1910년 혁명을 거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멕시코의 역사와 의지를 집약하고 있는 대작이었습니다.
나는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경제 문제에 못지않게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나 적자(嫡子)가 되지 못하는 태생적 과거에서부터 구미의 자본에 직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유럽 문화를 향한 지배층의 하염없는 짝사랑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먼저 학생들에게 코르테스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칼 같은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한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질문을 꺼낸 것을 금방 후회하였습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코르테스는 분명 침략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피를 물려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혼혈의 독립'이었습니다. 혼혈의 독립이란 인디오 원주민과 백인 정복자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분법은 이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구체적 실체로 존재하는 멕시코 민족이었습니다. 혼혈의 독립이란 이 현실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혼혈의 독립은 백인 혈통을 고수해 온 10%의 상층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파티스타 해방군으로 대표되는 하층의 인디오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층 10%에 대하여는 그들이 경제적 종속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여하며 인디오 문제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이라는 관점에서 관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파티스타 해방군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가두 선전에 나가는 참이었으며 손에는 핸드 스피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인디오에 대한 우월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판단에 최후까지 끼여들어 끈질기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열등감과 오만입니다. 심지어는 옷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끼여들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에도 끼여드는 것이 열등감과 오만이라는 자의식입니다. 멕시코 젊은이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와 평형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를 관통하고 있는 레포르마(Reforma) 거리는 '혁명'이라는 뜻과는 달리 오히려 혼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콜럼버스 동상과 아즈텍의 마지막 왕 쿠아우테목(Quahtemoc)의 동상, 독림기념탑과 혁명기념탑 등을 차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포르마 거리 북쪽 끝에는 유명한 삼문화광장(Plaza de las Tres Culturas)인 틀라테롤코가 있습니다. 삼문화광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스텍 유적과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교회, 그리고 현대적인 외무부 빌딩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지 세 개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1521년 쿠아우테목이 이끄는 아스텍군이 이곳을 사수하였으나 결국 코르테스에 의하여 함락된 패전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 350년이 지난 1968년에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다시 이곳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수백 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게 되는 곳입니다. 패전과 참상이 겹친 땅입니다.
그러나 비문에는 이곳은 패배의 땅이 아니라 '멕시코 탄생의 광장‘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민중이 탄생한 땅이며 '혼혈의 독립'을 선언한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혼혈의 독립은 멕시코의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곧 혼혈 민족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 는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대학 학생들이 코르테스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궁 벽화에 묘사되고 있는 코르테스의 모습은 오만하고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르테스를 묻는 나의 질문에 곤혹한 표정으로 한동안 대답이 없던 젊은이들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구체적인 현실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문화 광장을 거쳐 다시 소칼로 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마침 교사 노조원들이 시위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계승되고 있는 만큼의 과거만을 상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사의 주변부에 밀려나 있으면서도 세계 문학에 있어서는 그 중심부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그들의 이러한 '독립'과 '현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탁월한 성공에 대한 이유를 묻는 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도 바 로 그러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은 금세기의 모순을 집약한 것이며,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문학적 성취가 노벨상 숫자에 있지 않음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노벨 문학상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많은 수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혹시나 라틴아메리카를 계속 하여 유럽의 주변부에 묶어두려는 '노벨상의 정치학'이라는 비판에 대한 소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결과일 뿐 그들의 문학적 탐구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나는 멕시코 대학의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21세기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열등감과 오만의 이중성을 벗어버리는 용기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멕시코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멕시코 공항에 착륙하자 멕시코 도착을 알리는 기내 안내방송에 이어 '베사메 무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멕시 코 노래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여류작곡가 콘수엘로 벨라스케즈의 곡이었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키스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밤인 것처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노래입니다. 멕시코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던 노래 베사메 무초를 다시 생각 합니다.
정열과 태양의 나라, 그리고 상록(常綠)의 나라 멕시코가 21세기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