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하면 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숲
보리수 그늘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생(生)을 잇고 있으며 또 누군가의 생으로 이어집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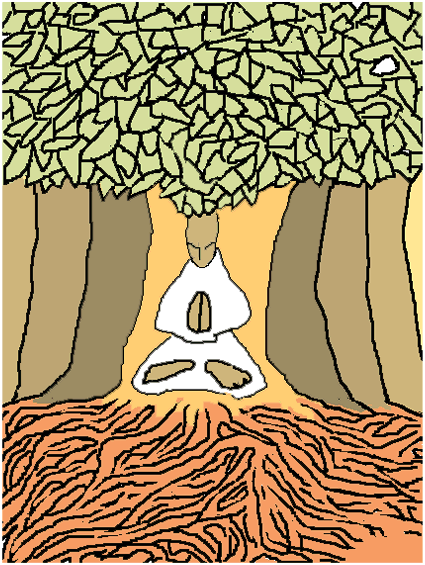
우리는 누군가의 생(生)을 잇고 있으며 또 누군가의 생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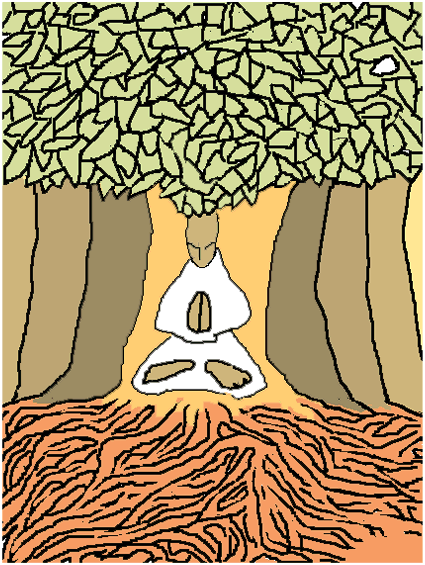
불교 4대 성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보리수입니다. 그의 탄생지인 룸비니 언덕의 아침 해도 좋고, 최초의 설법지인 사르나트의 잔디밭도 좋고, 그가 열반에 든 쿠시나가라의 와불(臥佛)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성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도 보리수가 가장 좋습니다. 보리수의 넓은 그늘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그 위를 지나는 시원한 바람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보리수 그늘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넓고 깊은 보리수 그늘은 먼저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줍니다. 머리에서 얼굴로, 어깨와 가슴으로 내려오는 서늘함과, 밑으로부터 맨발을 타고오르는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께에서 만나 온몸으로 분수처럼 퍼져나갑니다. 나는 붓다의 깨달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서늘한 보리수 그늘에서 분수처럼 전신을 적셔주는 시원함은 붓다의 개달음과 상관없이 인도가 안겨준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나의 심신을 씻어줍니다.
구도의 고행을 거듭하던 싯다르타는 이곳 부다가야의 니르자니강에 빠져 지친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 처녀 스타자가 공양하는 ‘젖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싯다르타는 고행을 통한 지금까지의 구도 방식을 버리고 강물에 몸을 씻은 다음, 이 보리수 아래로 오게 됩니다. ‘처녀의 젖죽’이 처녀가 만든 ‘죽’이었건 마을 아주머니가 공양한 ‘젖’이었건, 그것은 시비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싯다르타의 깨달음에 한 그릇의 젖죽이 의미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꺼질 듯한 등잔불이 기름 한 방울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켜세우듯 죽 한 그릇이 싯다르타에게 열어준 정신의 명징함은 결코 보리수 그늘에 못지않은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어쨌든 이곳은 왕자 자리를 버리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 걸어온 그 혹독한 고행의 끝이었습니다.
이곳 마하보디 사원에는 탑돌이를 하는 사람, 보리수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람, 가부좌로 명상에 잠긴 사람 들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나도 보리수 그늘 한 자락을 얻어 지친 여정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보리수는 물론 석가 당시의 나무가 아닙니다. 씨를 받아 이어오기 어느덧 4대째가 되는 112살 먹은 젊은 보리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교의 그 깊은 교리나 힌두 사상의 심오한 인간 존재의 비경을 더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젊은 보리수 밑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이승과 저승의 윤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맨발로 보리수 그늘에 앉아 간추려 보는 생각으로 유별난 감회에 젖습니다. 내게는 윤회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이 젊은 보리수가 이곳에서 대를 이어오듯 이승에서의 윤회는 수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손자의 모습에서 문득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손자를 통해 할아버지가 계승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단 혈연을 통한 계승뿐만 아니라 사제(師弟), 붕우(朋友)등 우리의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윤회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생을 잇고 있으며, 또 누군가의 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틀립없습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어지는 윤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이 보리수처럼 이승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회는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로 윤회할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집합체도 윤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다라처럼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는 다시 다음 사회로 이어지는 사회적 윤회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존재’의 윤회가 아니라 ‘관계’의 윤회입니다. 자녀에게, 벗에게, 그리고 후인들에게 좀더 나은 자기가 계승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좀더 나은 세상으로 윤회되기를 원하고 있음에 틀립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윤회를 불가(佛家)에서 윤회라 부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나의 생각을 윤회라는 그릇에 담아보면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처럼 숨막히는 신발 속에서 풀려나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쉬고 있는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몸의 무게에서 해방된 발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후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라며 스스로의 행보를 자계(自戒)하던 고승(高僧)의 시구가 생각납니다. 머리보다는 발이 먼저 깨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윤회되는 것이기보다 발(行蹟)이 윤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의 빛’을 찾기 위하여 벌써 여섯 달째 인도를 여행한다는 젊은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개인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 역사적인 관련을 개인이라는 단독자로 환원하고, 그 외로운 단독자를 윤회라는 무궁한 시공 속으로 던져서 해소시켜버리는 해탈의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혹시 기존의 모든 삶을 초개처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승의 모든 부조리를 통째로 승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철학에는 이승에 태어나 이승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까지 방기해버리는 위험은 없는가. 나는 궁극적 본질을 찾아 구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그와의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느 순간에 섬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의 수첩에서 ‘성공은 과정(Success is not a destination but a jouney)'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펴고 석가의 편력을 연필로 그려보았습니다. 석가의 세계는 인도 동북부의 매우 협소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 넓이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는 일’ 없이 ‘보는 일’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은 법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모든 시선을 거두어 오로지 안으로만 동공을 열어두는 것이 사색이라면 그러한 사색이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결국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일 속에서 길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결연함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오늘의 깨달음 위에 다시 내일의 깨달음을 쌓아감으로써 깨달음 그 자체를 부단히 높여나가는 과정의 총체일 뿐이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궁극적 존재에 대한 고뇌가 남는다면 최후로 인도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도가 도달한 ‘힌두의 세계’는 인도의 척박한 땅과 숨막히는 계급 사회를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도에 오면 수많은 성자(聖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자가 없는 사회도 좋은 사회라 할 수 없지만 성자가 많은 사회도 결코 행복한 사회는 아닌 법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인도를 적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인도를 찾아온다면 인도를 끝내기 전에 한 번쯤은 이 보리수를 찾기 바랍니다. 뜨거운 염천을 끊어주는 이 보리수 그늘에 앉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승에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젊은 보리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발에서 풀려 나와 대리석 바닥의 한기를 밟고 있는 당신의 두 발입니다. 머리보다는 발이 먼저 깨닫고 있으며, 수많은 발이 윤회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